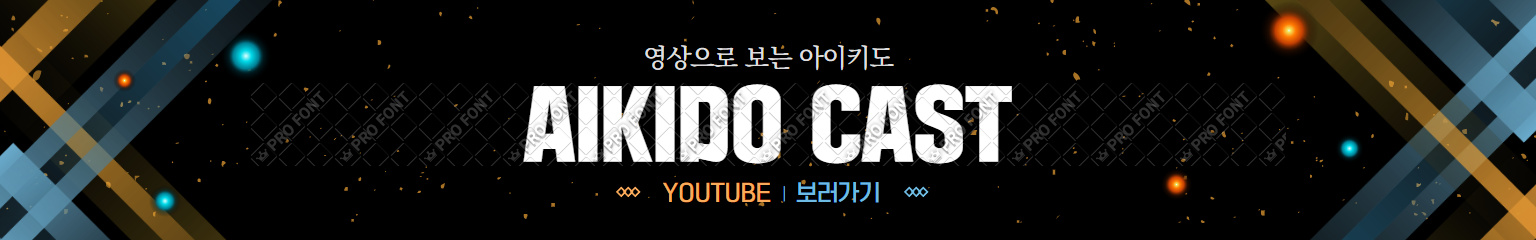철학자 카뮈는 1942년 저서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부조리는 세계를 구성하는 제1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전 에세이에서도 여러번에 걸쳐 논의한 바 있는 ‘부조리’는 불합리/불가해한 모순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미 논리 바깥에 위치하는 개념이기에 우리의 인지를 초월한 영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념의 구성언어를 약간 틀어 ‘부조리’를 개념이 아닌 인간이 처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부조리는 근대의 인간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과 더불어 언제나 상존해 온 불합리/불가해한 ‘모순적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의 탄생과 함께 해온 이야기 중 하나가 ‘신화神話’입니다. 신화는 얼핏 이해하기엔 신들의 파국적인 애정행각이나 인간사에 대한 개입의 역사처럼 읽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은유隱喩의 서사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인간이 주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점은 ‘주체’의 개념이 발명된 19세기 이후의 일이니까 인간사에서 극히 최근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내러티브를 생산해 내는 일(다름아닌 문학)에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고대의 이야기꾼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자리를 읽으며 동물과 인간과 신들의 형상을 떠올리고는 다양한 성격의 신의 존재의 막장드라마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지어내어 재미있는 이야기 듣기를 즐기는 동네사람들에게 떠들어 댔는데, 이 이야기 모음이 ‘신화神話’였죠. 따라서 신화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왜 삶은 이어지고 있는지 등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은유적 설명이었습니다.

이야기꾼들은 이야기를 보다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혹은 우리 삶이 기본적으로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차 있기에 이를 적용하여, 신들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를 ‘신의 섭리’ 혹은 ‘운명’이라 칭했습니다. 고대문명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 성향이 강했던 그리스에서 가장 먼저 체계적인 신화를 생산하여 확산시켰고, 여타 문명들도 이 이야기 체계를 자기 문화의 실정과 조건에 맞추어 변형하지만 큰 골자는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서구문명들이 공통적인 신화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 대표적인 부조리극인 ‘신화’의 종주국인 그리스는 아마도 부조리와 모순을 즐기는 민족인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최근에 가장 흥미있게 본 영화도 그리스 뉴웨이브의 부조리극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그리스 뉴웨이브를 주도한 아디너 레이첼 창가리, 알렉스 아브라니스 등의 쟁쟁한 감독들과 동등한 반열에 오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그리스 신화의 내러티브를 은막에 옮기는 탁월한 감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특히 란티모스는 여타 그리스 뉴웨이브와는 차별적으로 그리스 희비극의 해석에 있어서 본질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에 그리스 신화의 내러티브를 단순히 차용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던지는 인간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하는 근원본질적 질문은 다른 뉴웨이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영상 속에서 낯설고 기이한 표현방식과 신화적 상상력이 충돌하면서 영화문법적인 부조리를 생산한다는 방법론이 특이하죠. 란티모스는 불가해한 상황과 격리공간에 캐릭터를 위치시키고 신화에나 등장하는 전지적 신의 관점에서 캐릭터의 반응과 궤적을 찬찬히 관찰하는 연극적인 연출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체가 영화라서 이러한 연극적 형식은 영화적으로 재현되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는데, 란티모스의 개성은 이러한 낯선 어긋남에서 돋보입니다.

흔히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신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 신이 실제로 인간계에 나타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이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x ex machina’라 부르죠. 내러티브와의 개연성은 전혀 없지만 인간계에 넘치는 부조리를 풍자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계의 갈등을 신의 개입으로 간단히 해결해 버리고 관객들에게 해피엔딩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극 기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해결사로 등장하는 신 자신들의 세계도 부조리로 가득차 있지 않은가…
란티모스 영화에서 일관적으로 반복 등장하는 요소들로는 비현실적인 상황과 무대, 우화적 설정, 인공적인 미장센, 거슬리는 영상적/음향적 불쾌감과 사건의 개연성의 부재를 꼽습니다. 란티모스에 있어서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극적인 영화라는 ‘형식’ 그 자체가 란티모스가 보여주려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네 21’의 송경원 기자는 ‘세계의 존재방식을 탐문하는 부조리의 신, 인간을 탐닉하다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작품세계)’라는 글에서 철학자 베르그송의 설명을 인용하며 란티모스의 작품을 분석합니다. 베르그송은 그리스 희극의 캐릭터들은 행위보다 제스츄어를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물의 행위가 의식적 층위에서 인식된다면 제스츄어는 무의식적인 층위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인식하려는 의도도 없이 주입되는 반사이며, 란티모스가 부조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애써 창출하는 이유가 다름아닌 캐릭터의 제스츄어를 유도해내고 관객이 이를 무의식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도록 만든 영화적 기제(마키나machina)라고 합니다.
란티모스는 자신이 만들어낸 영화적 상황에 대해 그리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철학용어를 들자면 ‘소여所與’, 즉 이미 주어져 있어 ‘왜’라는 질문을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황은 불가항적 운명이며 개인의 의지는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되어 있습니다. 란티모스의 인물들은, 이전의 ‘승급심사소회’에서도 언급한 아미제의 ‘생사거래 붕두괴뢰生死去來 棚頭傀儡’의 꼭두각시와 마찬가지로, 마치 연극무대의 ‘괴뢰’와 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줄에 매달려 감독과 관객에 의해 관찰되는 대상입니다.

란티모스의 최근의 대표작 ‘더 랍스터(2015)’에서는 완벽한 짝을 찾길 원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호텔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배우자와 헤어졌거나 아직 남녀친구가 없는 개인들이며 법집행기관의 강제에 의해 호텔에 격리수용되었습니다. 호텔에 모인 남녀는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치며 정해진 기간인 45일 내에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사람에서 동물로 격하됩니다. 말그대로 사람의 모습에서 동물로 전락되어 숲에 버려지게 되죠.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지만 란티모스 영화에서는 이 모든 설정이 심각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자신을 ‘랍스터’로 만들어 달라고 희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랍스터일까? 영화의 제목이 ‘더 랍스터’이니 주인공이 랍스터가 되길 원하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말이죠. 제가 쉽게 이야기해버리면 재미없으니 관심있는 독자께서는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더 랍스터’의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영화의 서사는 연극적인 형식을 띠지만 일부러 일정 부분의 리얼리티를 지워버리고 설득을 포기한 혹은 의도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아 영화의 내용을 현실적인 해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란티모스는 영화제작의 클리셰인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의 흐름까지 갑자기 중지시키거나 잔인하게 제거하다가도 불현듯 이상야릇한 음향을 삽입하여 관객을 깜짝 놀라게도 합니다. 반복적인 패턴으로서 기계화되는 인물의 삶은 일상이 아닌 낯선 상황으로 변모되고 제스추어로서의 형식과 괴상하고 기이하고 파격적인 영상결과물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란티모스는 그의 작품에서 관객이 기이함 그 너머의 피안에 접속하기를 바라죠.
<랍스터와 낯설게하기(2-2)에서 계속됩니다.>
 글쓴이: 조현일
글쓴이: 조현일서울대학교 미술학부 산업디자인과 졸업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 건축대학원 졸업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이과대학 과정수료 (물리학)
2003년 3월 – 2007년 11월 극동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부 부장
2007년 12월 – 2012년 12월 주식회사 엔폴드 대표 (일본 동경 소재)
현재 도서출판 접힘펼침 대표 (용인시 기흥구 소재)